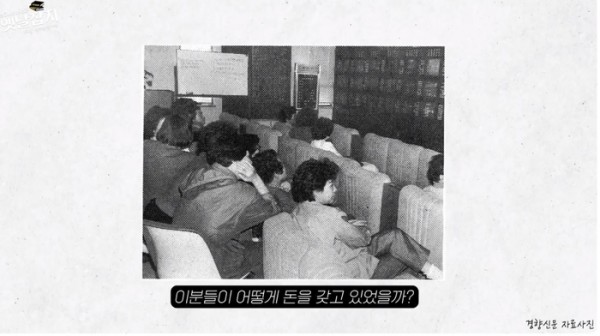고급 승용차 타고 증권사 등장한 그녀의 정체는? X들의 재테크[옛날잡지]
자유인105
생활문화
0
1319
01.15 16:09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1년간 전 세계 일주? 으리으리한 정원이 있는 내 집 마련? 무엇이든 일단 입가에 미소부터 지어지는 상상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본능은 1980년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 시대의 청춘, X세대는 어떤 식으로 재테크를 했을까요? 오늘 <옛날잡지>가 다룰 기사는 ‘레이디경향’ 1989년 11월호에서 다룬 ‘세태르포’입니다.
‘레이디경향’ 1989년 11월호에서 다룬 ‘세태르포’. 80년대 대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을까요?
“큰 손 예비군 증권가 여대생. 바야흐로 증권 대중화 시대를 맞아 일반 회사원은 물론 대학생, 그중에서도 여학생들이 시세 전광판 앞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어디에서 생긴 돈으로, 무슨 이유로 그들은 증시에 뛰어든 것일까.”
지금은 ‘주식’ 하면 한숨부터 나오지만, 이 시기만 해도 주식시장이 나름 상승세였다고 해요. 재테크의 한 방법으로 복부인은 물론 회사원까지 경쟁하듯 객장을 드나들었고 주가도 꾸준히 올라서 투자자들을 만족시켰던 분위기였죠.
다만 투기라는 선입견이 있어서 대학생에게는 다소 낯선 장르였는데 ‘그것도’ 여대생이 출몰했으니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증권사 담당자는 “대학생들이 2, 3년 전부터 꾸준히 있었지만, 전공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호기심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직접 투자를 하려는 학생들이 들었다”라고 상황을 전합니다.
증권가의 ‘큰손’이 된 대학생들, 돈의 출처는 바로 과외였습니다.
이들은 ‘본 투 비 부자’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들고 온 자금(?)의 출처는 바로 과외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일주일에 세 번 과외를 하며 영어나 수학을 가르치고 받는 금액은 한 달 평균 20만 원,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이었다고 하니, 말 그대로 ‘고액과외’였던 셈인데요. 그럼 이들은 왜 투자를 했을까요? 이 기사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1984년 모 증권사에서는 ‘모의주식투자경연대회’를 열었는데 투자실적에 따라 장학금 형식의 상금을 수여 해 왔고, 그러다 보니 경제, 경영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붐이 됐다고 해요. 이때 산 주식이 얼마까지 뛰었을까, 좀 궁금하네요.
자, 이렇게 모은 돈으로 무엇을 하려 했을까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E여대 J모양은 졸업 후 취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데다 경제적으로 독립하려는 여성들의 욕구는 반비례해 커지고 있다. 돈이 생긴다고 흥청망청 써버리지 않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 것이다.”
J양의 투자는 혼수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 뭐라도 해야 할 텐데 주식 투자를 통해 경제 흐름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죠.
마지막 포인트! 이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을까?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매달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로만 사 모은다, 두 번째는 안전한 증권저축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한다, 였는데요. 위험하고 과감한 투자를 우려하는 어른들의 목소리도 생생하게 실렸습니다.
이외에도 기사에는 흥미로운 K대생 L양이 등장합니다. ‘오너드라이버’로 집안이 부유해 학비 걱정 없어 보이는 그녀는 무슨 연유로 객장을 찾았을까요?
부모님의 심부름에서 깨우친 ‘인생 공부’ 덕이었습니다. 금융실명제와 인터넷 뱅킹이 가능해진 지금 시대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지만 당시에는 가족을 대신해 은행을 찾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찐’ 부자들의 재테크를 보며 노하우를 터득한 L양은 오며 가며 들었던 지식으로 투자를 해서 매달 20%의 수익을 올렸고, 무려 470만 원의 잔액을 유지하게 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시기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700원. 상고출신 한국은행 직원 월급이 41만7천 원이던 시절입니다.
같은 달 기획 기사인 ‘캠퍼스 라이프’에서는 대학가 앞에 문을 연 발 빠른 카페 사장님들의 인터뷰가 실려 있는데요. 사업에도 성공했을까요?
그럼, 이 시절 대학생들은 주식으로만 돈을 벌었을까요? 아닙니다. 같은 달 기획 기사인 ‘캠퍼스 라이프’에서는 대학가 앞에 문을 연 카페 사장님들의 인터뷰가 실려 있는데요. ‘대학생이 직접 경영하는’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동국대와 숭의여전(현 숭의여대) 출신의 자매가 경희대 앞에서 카페를 열었고요. 무용과와 건축과를 다니는 친구 2명이 만든 카페도 있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경험만 흑자!
“깔린 외상값만 200만 원 정도... 그래도 카페는 학생으로서 한번 해 볼 만한 것이다.”
청춘. 참 좋은 말이지만 또 고생이 동반되는 참 애틋한 말인 거 같습니다. 지나와 돌이켜보니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 돌아봤던 1980년대는 어떠셨나요? ‘90년대생이 온다’가 아닌 ‘90년이 온다’로 점철되던 이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유튜브 <옛날잡지>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부자가 되고 싶다는 본능은 1980년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 시대의 청춘, X세대는 어떤 식으로 재테크를 했을까요? 오늘 <옛날잡지>가 다룰 기사는 ‘레이디경향’ 1989년 11월호에서 다룬 ‘세태르포’입니다.
‘레이디경향’ 1989년 11월호에서 다룬 ‘세태르포’. 80년대 대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을까요?
“큰 손 예비군 증권가 여대생. 바야흐로 증권 대중화 시대를 맞아 일반 회사원은 물론 대학생, 그중에서도 여학생들이 시세 전광판 앞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어디에서 생긴 돈으로, 무슨 이유로 그들은 증시에 뛰어든 것일까.”
지금은 ‘주식’ 하면 한숨부터 나오지만, 이 시기만 해도 주식시장이 나름 상승세였다고 해요. 재테크의 한 방법으로 복부인은 물론 회사원까지 경쟁하듯 객장을 드나들었고 주가도 꾸준히 올라서 투자자들을 만족시켰던 분위기였죠.
다만 투기라는 선입견이 있어서 대학생에게는 다소 낯선 장르였는데 ‘그것도’ 여대생이 출몰했으니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증권사 담당자는 “대학생들이 2, 3년 전부터 꾸준히 있었지만, 전공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호기심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직접 투자를 하려는 학생들이 들었다”라고 상황을 전합니다.
증권가의 ‘큰손’이 된 대학생들, 돈의 출처는 바로 과외였습니다.
이들은 ‘본 투 비 부자’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들고 온 자금(?)의 출처는 바로 과외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일주일에 세 번 과외를 하며 영어나 수학을 가르치고 받는 금액은 한 달 평균 20만 원,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이었다고 하니, 말 그대로 ‘고액과외’였던 셈인데요. 그럼 이들은 왜 투자를 했을까요? 이 기사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1984년 모 증권사에서는 ‘모의주식투자경연대회’를 열었는데 투자실적에 따라 장학금 형식의 상금을 수여 해 왔고, 그러다 보니 경제, 경영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붐이 됐다고 해요. 이때 산 주식이 얼마까지 뛰었을까, 좀 궁금하네요.
자, 이렇게 모은 돈으로 무엇을 하려 했을까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E여대 J모양은 졸업 후 취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데다 경제적으로 독립하려는 여성들의 욕구는 반비례해 커지고 있다. 돈이 생긴다고 흥청망청 써버리지 않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 것이다.”
J양의 투자는 혼수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 뭐라도 해야 할 텐데 주식 투자를 통해 경제 흐름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죠.
마지막 포인트! 이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을까?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매달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로만 사 모은다, 두 번째는 안전한 증권저축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한다, 였는데요. 위험하고 과감한 투자를 우려하는 어른들의 목소리도 생생하게 실렸습니다.
이외에도 기사에는 흥미로운 K대생 L양이 등장합니다. ‘오너드라이버’로 집안이 부유해 학비 걱정 없어 보이는 그녀는 무슨 연유로 객장을 찾았을까요?
부모님의 심부름에서 깨우친 ‘인생 공부’ 덕이었습니다. 금융실명제와 인터넷 뱅킹이 가능해진 지금 시대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지만 당시에는 가족을 대신해 은행을 찾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찐’ 부자들의 재테크를 보며 노하우를 터득한 L양은 오며 가며 들었던 지식으로 투자를 해서 매달 20%의 수익을 올렸고, 무려 470만 원의 잔액을 유지하게 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시기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700원. 상고출신 한국은행 직원 월급이 41만7천 원이던 시절입니다.
같은 달 기획 기사인 ‘캠퍼스 라이프’에서는 대학가 앞에 문을 연 발 빠른 카페 사장님들의 인터뷰가 실려 있는데요. 사업에도 성공했을까요?
그럼, 이 시절 대학생들은 주식으로만 돈을 벌었을까요? 아닙니다. 같은 달 기획 기사인 ‘캠퍼스 라이프’에서는 대학가 앞에 문을 연 카페 사장님들의 인터뷰가 실려 있는데요. ‘대학생이 직접 경영하는’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동국대와 숭의여전(현 숭의여대) 출신의 자매가 경희대 앞에서 카페를 열었고요. 무용과와 건축과를 다니는 친구 2명이 만든 카페도 있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경험만 흑자!
“깔린 외상값만 200만 원 정도... 그래도 카페는 학생으로서 한번 해 볼 만한 것이다.”
청춘. 참 좋은 말이지만 또 고생이 동반되는 참 애틋한 말인 거 같습니다. 지나와 돌이켜보니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 돌아봤던 1980년대는 어떠셨나요? ‘90년대생이 온다’가 아닌 ‘90년이 온다’로 점철되던 이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유튜브 <옛날잡지>에 댓글로 알려주세요.